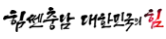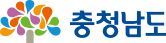“연아!” 불길한 예감에 단은 연을 부르짖었다.
핏물로 젖은 북문으로 들어서자 참혹한 임존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성안은 온통 시체투성이였다. 매캐한 연기가 아직도 전쟁의 상흔을 조잘거리고 있었다.
단은 머리가 빙그르르 돌았다. 정신마저 혼미해졌다. 너무나도 참혹한 광경에 벌린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다.
단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달래며 성 안을 둘러보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다. 그러나 성 안을 살필수록 단의 기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고 말았다.
정상 쪽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에서는 발 디딜 곳조차 없었다. 시체와 핏물로 뒤범벅이 되어 차마 눈뜨고 살필 수조차 없었다. 단의 얼굴이 분노와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정상 쪽을 돌아 남문 쪽으로 향할 때, 산모퉁이에서 한 노인이 주저앉은 채 울고 있는 모습이 단의 눈에 들어왔다.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보자 단은 반갑기 그지없었다. 이제야 연의 소식을 물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단은 서둘러 노인에게로 다가갔다. 단을 본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두려움에 몸을 사렸다.
“누구요? 당나라 군사는 아니지요?”그제야 단은 노인의 심정을 이해하고는 공손히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저는 백제 사람입니다.”
백제 사람이라는 말에 노인은 그제야 마음을 놓고 울음을 터뜨렸다. 노인의 울음에 단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단을 바라보았다.
“내 평생에 이런 일을 겪다니.”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왔소?”
노인의 물음에 단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연의 소식도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눈물을 거두고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단으로서는 차마 듣지 아니함만 못한 이야기였다.
임존성이 함락되고 임존성 안에 있던 모든 백제 인들은 당나라군의 포로가 되었다. 군사들과 젊은 남자들은 대부분 흑치상지의 휘하로 들어가고 젊은 처자들은 당나라 장수들의 첩이 되거나 군사들의 차지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단은 가슴이 터질 듯 요동쳤다.
“그럼 혹시 연이라고 아시는지요?” 연이라는 말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초림이라는 아이와 여기에 함께 왔는데 그 아이는 당나라 풍사귀라는 놈이 데려갔지. 첩으로 삼았어.”
단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그만 망연자실 하고 말았다. 푸른 하늘이 그대로 쏟아져 내리고 마는 듯 했다.
“저 개 같은 놈들은 사람을 전리품으로 삼았어. 너도 갖고, 나도 갖고. 무슨 물건을 나누어 갖듯이 말이야.”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노인은 또 다시 흐느껴 울었다. 단은 너무 큰 충격에 눈물을 흘리지도 못했다. 멍한 시선으로 그저 건너편 임존산 산기슭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 한 순간 벌떡 일어서 짐승과도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다.
“개 같은 신라 놈들이 오랑캐를 끌어들여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 개 같은 신라 놈들아!”
단의 울부짖음은 멈출 줄을 몰랐다. 임존산도 흐느끼고 마른 나뭇가지도 울어댔다.
지나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
노인은 그런 단을 두고 흐느적거리며 남문을 나섰다. 쓰러질 듯 위태한 걸음걸이가 노인의 아픔과 슬픔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단은 성벽에 쓰러져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다. 구름이 하늘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동안에도, 바람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동안에도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한참을 흐느껴 울어대던 단은 한 순간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임존산을 득달같이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산천을 떠내려가던 당나라 군선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 군선에 연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뒤늦게 떠올랐던 것이다.
“연아, 연아!”
단은 연신 연을 부르짖으며 오산천을 따라 내달렸다. 구름이 내려앉은 듯 흰 갈대꽃이 처연하게 단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달리고 또 달려도 당나라 군선은 이미 오간데 없이 자취도 없었다.
멀리 끝없이 펼쳐진 들판 너머로 가물가물 은빛 오산천만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망연자실한 얼굴로 무심한 오산천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어.” 단은 연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스스로를 자책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단은 넋을 잃은 채 중얼거렸다. 그러다가는 자리를 일어서 터덜터덜 걸음을 옮겨놓았다. 보원사로 향했던 것이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연재기사]
- 의열단 - (16)저격수
- 의열단 (15)동지(同志)
- 의열단 (13) 원탁 밀담
- 의열단 (12) 문선식
- 의열단 (11) 대한의림부
- 의열단(10)특사 김규식
- 의열단 (9)실망
- 의열단 (8)하나의 염원
- 의열단 (7)만남
- 의열단 (6) 상해행
- 의열단 (5) 변치 않는 것
- 의열단 (4) 약산 김원봉
- 의열단 (2) 경고
- 의열단(1) 잠입
- 천명 (47·끝) 탕평책
- 천명 (46) 숙청
- 천명 (45) 자리다툼
- 천명 (44) 갈등
- 천명(43) 모략
- 천명 (42)친국(親鞠)
- 천명 (41) 의문
- 천명(40) 사상
- 천명 (39) 결단
- 천명 (38) 제사
- 천명 (37) 물거품
- 천명 (36) 논쟁
- 천명 (35) 영조의 노여움
- 천명 (34) 물거품
- 천명 (33) 투석전
- 천명(32) 패전
- 천명 (30) 요셉
- 천명 (28) 대치
- 천명 (27) 연통
- 천명 (26) 칼끝
- 천명 (25)약조
- 천명 (24)논쟁
- 천명 (23)천국
- 천명 (22) 마리아
- 천명 (21) 서신
- 천명 (20) - 밀사
- 천명 (19) 금마공소(金馬公所)
- 천명 (18) 봉칠규
- 천명 (17) 만남
- 천명 (16) 최처인
- 천명 (16) 최처인
- 천명 (15) 실토
- 천명 (14) 을선
- 천명 (13) 사미승
- 천명 (12) 용봉사
- 천명 (11) 심문
- 천명 (10) 새로운 세상
- 천명 (9) 칼
- 천명 (8) 행적
- 천명 (7) 접장
- 천명 (6) 행적
- 천명 (4) 흔적
- 천명 (3) 초검관
- 천명 (2) 시쳉
- 천명(1) 음모(陰謀)
- 미소(끝) 미륵보살
- 미소 (64) 눈물
- 미소 (63) 패전
- 미소 (62) 야차
- 미소 (61) 북쪽 성벽
- 미소 (60) 갈대
- 미소 (59) 설득
- 미소 (58) 태자 융
- 미소 (57) 한숨
- 미소 (56) 후회
- 미소 (55)배신
- 미소(54) 편지
- 미소 (53) 회유
- 미소 (52) 성벽 보수
- 미소 (51) 유혹
- 미소 (50) 신라의 퇴각
- 미소 (50) 김유신
- 미소 (48) 마지막 영웅
- 미소 (47) 불암(佛岩)
- 미소 (46) 공양
- 미소 (45) 석탑
- 미소(44) 향천사
- 미소 (43) 흰 소
- 미소 (42) 금오산
- 미소 (41) 향천사
- 미소 (40) 맹세
- 미소 (39) 환호성
- 미소 (38) 퇴각
- 미소 (37) 화살
- 미소 (36) 의기투합
- 미소 - (35) 지수신
- 미소 (34) 불타는 군량
- 미소 (33) 야습-2
- 미소 (32) 야습-1
- 미소 (31) 야차 ‘지수신’
- 미소 (30) 혈전
- 미소 (29) 김유신
- 미소(28) 별부장
- 미소 (27) 내분
- 미소 (26) 흑치상지
- 미소 (25) 삼십만 대군
- 미소 (24) 달빛속으로
- 미소 (23) 석불
- 미소 (22) 석불
- 미소 (21) 구자산
- 미소 (20) 보원사 인연
- 미소 (19) 식비루
- 미소 (18) 임존성
- 미소 (17) 신라군
- 미소 (16) 풍전등화
- 미소 (15) 월주거리
- 미소 (14) 무술경연대회
- 미소 (12) 의각대사
- 미소(11) 화문의 정체
- 미소(10) 달빛 차기
- 미소(9) 화문
- 미소(8) 함정
- 미소(7) 탈출
- 미소(6) 화문을 만나다
- 연재소설 미소 (5) 아비규환
- 미소 (4) 바다도적
- 천판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