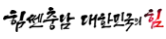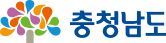백제는 곧 망할 것이라고들 한다. 이미 피난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임존성으로 향한 사람들도 있다. 사비성이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은 임존성과 가량협일 것이다. 이곳 가량협은 서해로 통하는 관문이었다. 때문에 백제의 숨통이기도 한 가량협은 철저하게 짓밟힐 것이다. 단은 생각이 이에 이르자 손을 내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깎아지른 낭떠러지와 막아선 바위만이 전부였다. 연은 여전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눈까지 지그시 감은 채 기도에 몰입되어 있었다.
단은 돌길을 돌아 내려갔다. 한 모퉁이를 돌자 산으로 오르는 희미한 오솔길이 어렴풋이 보였다.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니고 아마도 노루나 멧돼지가 다니는 짐승길인 모양이었다. 단은 그 길을 따라 산을 올랐다. 가파른 등성이를 돌아 오르자 순간 훤하게 정상이 보였다. 단은 그곳에서 숨을 돌리고는 다시 불암 뒤쪽으로 내려갔다. 예전에 누군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불암 뒤에는 고승이 수행을 하던 작은 동굴이 있다고 말이다.
길 없는 길을 만들며 겨우겨우 불암 뒤에 서자 정말 작은 동굴이 눈에 들어왔다. 한 사람이 겨우 머물만한 곳이었다. 동굴이라기보다는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만한 바위 밑이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보이지는 않았다. 나무로 우거지고 바위로 둘러싸여 숨어있기에는 딱 좋은 곳이었다. 단은 마음이 놓였다. 이곳이라면 연이 숨어있기에 알맞은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연의 불안한 목소리가 건너편에서 들려왔다.
“어디 있어?”
연의 부름에 단은 곧 대답했다.
“어디 있긴, 앞에 있잖아.”
단의 목소리를 듣자 연은 적이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곧 의아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거긴 어떻게 간 거야?”
“잠깐만 기다려.”
단은 곧 발길을 돌려 가파른 바위를 오르고 골짜기를 내려갔다. 그리고는 연을 이끌고 다시 건너편 동굴로 향했다. 미끄러운 돌길은 위험천만이었다. 발을 옮길 때마다 돌이 굴러 떨어지고 미끄러졌다. 연의 입에서 당혹한 비명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그때마다 단은 연의 손을 꼭 거머쥐었다. 보드랍고 매끈한 감촉이 더없이 좋았다. 이 세상 무엇을 쥐어도 이런 설렘과 행복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골짜기를 오르고 바위를 내려오자 다시 동굴의 앞에 다다랐다.
“여긴?”
“잘 들어. 이다음에 혹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여기로 피신을 하도록 해. 먹을 것만 갖고 오면 아무도 너를 찾지 못할 거야.”
연은 단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어쩌면 내가 돌아오기 전에 신라 놈들이 이 땅에 들어올지도 몰라. 그때는 여기로 피신을 해 있으라고.”
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는 귀밑머리가 바람에 하얀 볼을 간질였다. 햇살에 붉은 입술이 더욱 짙었다. 바위 틈 진달래꽃보다도 더 붉었다. 단은 연의 두 손을 마주 잡았다.
“불암에 기도를 올렸으니 무사할 거야.”
마음의 위안을 주려 단은 무사할 거라며 속삭였다. 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해주고자 함이었다. 경계산 너머로 떨어져 내리는 노을이 유난히도 붉었다. 멀리 여촌현의 저녁 안개가 황금빛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
회상에서 벗어난 단은 핏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야산을 내려갔다. 보원사가 여전한 모습으로 발아래 오도카니 앉아있었다. 얼마 만에 보는 정겨운 모습인지 몰랐다. 가슴이 뛰고 발걸음이 절로 가벼웠다. 그러나 왠지 모를 불안함에 단은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문무왕과 김유신은 군량 부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군량이 모두 불타 진퇴양난에 빠져버리고만 것이다.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소.”
문무왕의 비장한 말에 긴 칼을 찬 김유신이 나섰다.
“맞습니다. 이제 저 임존성을 마지막으로 치고 만에 하나 실패하면 회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유신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장수는 없었다. 그러자 문무왕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연재기사]
- 의열단 - (16)저격수
- 의열단 (15)동지(同志)
- 의열단 (13) 원탁 밀담
- 의열단 (12) 문선식
- 의열단 (11) 대한의림부
- 의열단(10)특사 김규식
- 의열단 (9)실망
- 의열단 (8)하나의 염원
- 의열단 (7)만남
- 의열단 (6) 상해행
- 의열단 (5) 변치 않는 것
- 의열단 (4) 약산 김원봉
- 의열단 (2) 경고
- 의열단(1) 잠입
- 천명 (47·끝) 탕평책
- 천명 (46) 숙청
- 천명 (45) 자리다툼
- 천명 (44) 갈등
- 천명(43) 모략
- 천명 (42)친국(親鞠)
- 천명 (41) 의문
- 천명(40) 사상
- 천명 (39) 결단
- 천명 (38) 제사
- 천명 (37) 물거품
- 천명 (36) 논쟁
- 천명 (35) 영조의 노여움
- 천명 (34) 물거품
- 천명 (33) 투석전
- 천명(32) 패전
- 천명 (30) 요셉
- 천명 (28) 대치
- 천명 (27) 연통
- 천명 (26) 칼끝
- 천명 (25)약조
- 천명 (24)논쟁
- 천명 (23)천국
- 천명 (22) 마리아
- 천명 (21) 서신
- 천명 (20) - 밀사
- 천명 (19) 금마공소(金馬公所)
- 천명 (18) 봉칠규
- 천명 (17) 만남
- 천명 (16) 최처인
- 천명 (16) 최처인
- 천명 (15) 실토
- 천명 (14) 을선
- 천명 (13) 사미승
- 천명 (12) 용봉사
- 천명 (11) 심문
- 천명 (10) 새로운 세상
- 천명 (9) 칼
- 천명 (8) 행적
- 천명 (7) 접장
- 천명 (6) 행적
- 천명 (4) 흔적
- 천명 (3) 초검관
- 천명 (2) 시쳉
- 천명(1) 음모(陰謀)
- 미소(끝) 미륵보살
- 미소 (64) 눈물
- 미소 (63) 패전
- 미소 (62) 야차
- 미소 (61) 북쪽 성벽
- 미소 (60) 갈대
- 미소 (59) 설득
- 미소 (58) 태자 융
- 미소 (57) 한숨
- 미소 (56) 후회
- 미소 (55)배신
- 미소(54) 편지
- 미소 (53) 회유
- 미소 (52) 성벽 보수
- 미소 (51) 유혹
- 미소 (50) 신라의 퇴각
- 미소 (50) 김유신
- 미소 (48) 마지막 영웅
- 미소 (47) 불암(佛岩)
- 미소 (46) 공양
- 미소 (45) 석탑
- 미소(44) 향천사
- 미소 (43) 흰 소
- 미소 (42) 금오산
- 미소 (41) 향천사
- 미소 (40) 맹세
- 미소 (39) 환호성
- 미소 (38) 퇴각
- 미소 (37) 화살
- 미소 (36) 의기투합
- 미소 - (35) 지수신
- 미소 (34) 불타는 군량
- 미소 (33) 야습-2
- 미소 (32) 야습-1
- 미소 (31) 야차 ‘지수신’
- 미소 (30) 혈전
- 미소 (29) 김유신
- 미소(28) 별부장
- 미소 (27) 내분
- 미소 (26) 흑치상지
- 미소 (25) 삼십만 대군
- 미소 (24) 달빛속으로
- 미소 (23) 석불
- 미소 (22) 석불
- 미소 (21) 구자산
- 미소 (20) 보원사 인연
- 미소 (19) 식비루
- 미소 (18) 임존성
- 미소 (17) 신라군
- 미소 (16) 풍전등화
- 미소 (15) 월주거리
- 미소 (14) 무술경연대회
- 미소 (12) 의각대사
- 미소(11) 화문의 정체
- 미소(10) 달빛 차기
- 미소(9) 화문
- 미소(8) 함정
- 미소(7) 탈출
- 미소(6) 화문을 만나다
- 연재소설 미소 (5) 아비규환
- 미소 (4) 바다도적
- 천판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