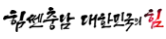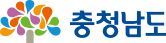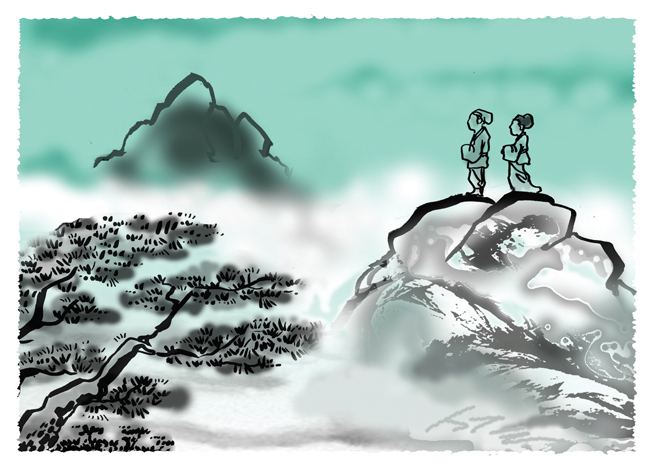
 단은 살며시 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탑을 지나 안양문 밖으로 향했다. 부릅뜬 두 눈이 곧 튀어나올 것만 같은 금강역사가 지키고 서있는 금강문을 지나 사왕천의 네 천왕이 지키고 선 천왕문을 나섰다. 물을 머금은 역천의 버드나무가 푸릇푸릇하게 절집 담장 밖에서 손짓을 하고 있었다.
단은 살며시 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는 탑을 지나 안양문 밖으로 향했다. 부릅뜬 두 눈이 곧 튀어나올 것만 같은 금강역사가 지키고 서있는 금강문을 지나 사왕천의 네 천왕이 지키고 선 천왕문을 나섰다. 물을 머금은 역천의 버드나무가 푸릇푸릇하게 절집 담장 밖에서 손짓을 하고 있었다.잘 휘어진 소나무가 양 옆으로 늘어선 길을 지나자 일주문이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었다. 일주문을 나서자 그 앞으로 세심교 맑은 물이 봄 소리로 왁자했다. 졸졸거리는 물소리에 귀를 따갑게 하는 개구리 소리, 그 사이로 간간히 날아드는 맑은 새들의 노래 소리로 속세는 정신이 없었다.
“어딜 가는데?”
연의 물음에도 단은 대답이 없었다. 수정봉 하늘에 휘날리는 깃발이 바람에 요란했다. 거듭 묻는 말에도 단은 묵묵히 연의 손만을 이끌 뿐이었다. 봄날의 설렘이 가슴을 벅차게 했다. 연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거면 족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언덕과 꽃다지 요란한 밭두둑으로 한가한 염소 가족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비릿한 풀내음이 지천으로 폴폴 솟아올랐다.
역천을 따라 내려가자 경계산 언저리로 푸른 솔이 빽빽했다. 물가의 버들가지도 앙증맞은 솜털을 살며시 내밀고 있었다. 검붉은 바위와 흰 바윗돌이 맑은 물에 장단을 맞추며 화사한 봄날을 장식하고 있었다.
물은 아직 시리도록 찼다. 역천을 건넌 단은 쥐바위를 건너 웅크린 고양이 바위로 향했다. 검은 쥐바위는 용트림하는 솔과 신갈나무로 뒤덮여 있었다. 뒤에 쫓아오는 고양이 바위를 피해 역천을 건너고 솔과 신갈나무로 뒤집어 써 숨은 것이다. 그러나 웅크린 고양이 바위는 그런 쥐바위를 못 알아볼 리 없었다. 발톱을 잔뜩 세우고 이를 드러낸 채 쥐바위를 곧 덮칠 기세였다.
가파른 돌길을 오르자 연은 그제야 알았다. 단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말이다. 어느새 가슴이 차오르며 숨이 가빠왔다.
“좀 쉬었다 올라가자!”
연의 힘겨워함에 단은 그제야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 고운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불암(佛岩)에 가려는 거야?”
연의 물음에 단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응, 전설이 맞나 보려고.”
전설이 맞나 알아본다는 말에 연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까짓 전설을 믿느냐는 것이었다.
부처바위라는 불암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바위였다. 영험함이 있어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량상단 사람들도 상단이 떠나기 전에는 꼭 축원을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전설의 상이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부처의 상이 나타나면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불암의 영험함을 믿었다. 돌길은 사람들의 발길로 반들반들 닳아있었다.
숨을 돌리고 아래를 굽어보자 역천의 하얀 물이 비단 폭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건너편 산등성이로는 굴참나무 사이로 붉은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한창이었다. 멀리 보원사의 검은 기왓장이 푸른 솔 사이로 언뜻언뜻 가물거렸다.
“부처님 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난 믿어. 우리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량상단이 아무 일 없이 그 험한 바다를 건너 다녔지 않았겠어.”
단의 말에 연도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의현대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사람이 간절히 바라면 꼭 이루어진다고 말이야. 부처님이 아니라도.”
단과 연은 서로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알았다. 무사히 장안을 다녀와 혼인을 하는 것이란 것을 말이다.
숨을 돌린 두 사람은 다시 돌길을 올랐다. 가파른 돌길은 서로의 숨소리를, 서로의 발걸음을 느끼게 해주었다. 잡은 손에서는 땀까지 촉촉이 배어나왔다. 기분 좋은 매끄러움이 손바닥으로 전해져왔다.
숨이 턱에까지 차오르자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었다. 머리 위로 커다란 암벽이 가로막아 섰던 것이다. 불암이었다. 비스듬히 앞을 향해 기울어진 바위는 나무꾼들에게 비를 피하게 해주기도 하고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쉼터이기도 했다.
오후 햇살에 바위는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단은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멀리 여촌현의 산줄기가 가물가물 흘러가고 있었다. 저 너머로 험한 서해바다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너머로 당나라가 있고 장안이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떠나야 한다. 가녀린 연을 둔 채 말이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연재기사]
- 의열단 - (16)저격수
- 의열단 (15)동지(同志)
- 의열단 (13) 원탁 밀담
- 의열단 (12) 문선식
- 의열단 (11) 대한의림부
- 의열단(10)특사 김규식
- 의열단 (9)실망
- 의열단 (8)하나의 염원
- 의열단 (7)만남
- 의열단 (6) 상해행
- 의열단 (5) 변치 않는 것
- 의열단 (4) 약산 김원봉
- 의열단 (2) 경고
- 의열단(1) 잠입
- 천명 (47·끝) 탕평책
- 천명 (46) 숙청
- 천명 (45) 자리다툼
- 천명 (44) 갈등
- 천명(43) 모략
- 천명 (42)친국(親鞠)
- 천명 (41) 의문
- 천명(40) 사상
- 천명 (39) 결단
- 천명 (38) 제사
- 천명 (37) 물거품
- 천명 (36) 논쟁
- 천명 (35) 영조의 노여움
- 천명 (34) 물거품
- 천명 (33) 투석전
- 천명(32) 패전
- 천명 (30) 요셉
- 천명 (28) 대치
- 천명 (27) 연통
- 천명 (26) 칼끝
- 천명 (25)약조
- 천명 (24)논쟁
- 천명 (23)천국
- 천명 (22) 마리아
- 천명 (21) 서신
- 천명 (20) - 밀사
- 천명 (19) 금마공소(金馬公所)
- 천명 (18) 봉칠규
- 천명 (17) 만남
- 천명 (16) 최처인
- 천명 (16) 최처인
- 천명 (15) 실토
- 천명 (14) 을선
- 천명 (13) 사미승
- 천명 (12) 용봉사
- 천명 (11) 심문
- 천명 (10) 새로운 세상
- 천명 (9) 칼
- 천명 (8) 행적
- 천명 (7) 접장
- 천명 (6) 행적
- 천명 (4) 흔적
- 천명 (3) 초검관
- 천명 (2) 시쳉
- 천명(1) 음모(陰謀)
- 미소(끝) 미륵보살
- 미소 (64) 눈물
- 미소 (63) 패전
- 미소 (62) 야차
- 미소 (61) 북쪽 성벽
- 미소 (60) 갈대
- 미소 (59) 설득
- 미소 (58) 태자 융
- 미소 (57) 한숨
- 미소 (56) 후회
- 미소 (55)배신
- 미소(54) 편지
- 미소 (53) 회유
- 미소 (52) 성벽 보수
- 미소 (51) 유혹
- 미소 (50) 신라의 퇴각
- 미소 (50) 김유신
- 미소 (48) 마지막 영웅
- 미소 (47) 불암(佛岩)
- 미소 (46) 공양
- 미소 (45) 석탑
- 미소(44) 향천사
- 미소 (43) 흰 소
- 미소 (42) 금오산
- 미소 (41) 향천사
- 미소 (40) 맹세
- 미소 (39) 환호성
- 미소 (38) 퇴각
- 미소 (37) 화살
- 미소 (36) 의기투합
- 미소 - (35) 지수신
- 미소 (34) 불타는 군량
- 미소 (33) 야습-2
- 미소 (32) 야습-1
- 미소 (31) 야차 ‘지수신’
- 미소 (30) 혈전
- 미소 (29) 김유신
- 미소(28) 별부장
- 미소 (27) 내분
- 미소 (26) 흑치상지
- 미소 (25) 삼십만 대군
- 미소 (24) 달빛속으로
- 미소 (23) 석불
- 미소 (22) 석불
- 미소 (21) 구자산
- 미소 (20) 보원사 인연
- 미소 (19) 식비루
- 미소 (18) 임존성
- 미소 (17) 신라군
- 미소 (16) 풍전등화
- 미소 (15) 월주거리
- 미소 (14) 무술경연대회
- 미소 (12) 의각대사
- 미소(11) 화문의 정체
- 미소(10) 달빛 차기
- 미소(9) 화문
- 미소(8) 함정
- 미소(7) 탈출
- 미소(6) 화문을 만나다
- 연재소설 미소 (5) 아비규환
- 미소 (4) 바다도적
- 천판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