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아지매가 쓰는 귀촌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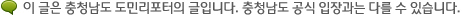
내가 살고 있는 홍성에는 빈집들이 눈에 띈다. 우리 집 앞에도 2채의 빈집이 있고 뒤에도 1채의 빈집이 있다.
우리 집에 놀러오는 지인들은 종종 이런 빈집을 탐내곤 했다. 우리도 빈집에 누군가 들어와 이웃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빈집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는데 빈집주인이 빌려주지도 팔지도 않는다고 전해 들었다. 그래서 만나지도 않은 빈집 주인을 속으로 원망하기도 했다.
빈집을 몇 년 만 방치하면 나무가 지붕보다 높이 자라고 풀이 자라 집의 형체가 사라진다. 지붕과 집 안 곳곳이 부식이 되어서 썩기 시작한다. 결국 폐가가 되어 거미줄이 채워진 귀신의 집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아이들도 빈집에 들어가면 온갖 상상에 까무러치면서 뛰쳐나오고 해가 지는 밤에는 근처도 안 가려고 한다. 귀촌 첫해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무서웠다. 빈집을 지나가면 뭐가 툭 나올 것만 같은 상상에 발걸음을 다시 돌려 집으로 줄행랑을 치기도 했다.
몇 해가 지나면서 빈집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우리 집 앞 한집의 아들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을 찾아 살림은 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텃밭을 일군다. 첫해에는 감자정도만 하면서 감자 심을 때와 감자 수확할 때 정도만 찾아왔는데 몇 해가 지난 지금은 나무도 곳곳에 심고 경작하는 작물도 훨씬 많아져 매주 찾아와 물을 주고 밭을 일군다.
물론 빈집은 태풍에 무너져 지붕이 내려앉고 흙집이어서 곳곳이 무너져 집안에서 살림을 할 수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 찾아와 땀을 흘린다. 지난 가을에는 무를 수확했는데 우리도 필요하면 가져가란다.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 받으니 자신은 텃밭을 일구지만 자신이 먹는것보다는 주변에 나누어주고 싶어 이렇게 경작한다고 말씀하신다. 수확물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곳에 대한 애정으로 매주 그곳을 찾아 오는 것이다.

▲ 빈집은 곳곳이 무너져 가지만 애정을 가진 집주인이 매주 밭농사를 위해 찾아 온다.
또 다른 빈집은 지붕도 튼실하고 집안도 대부분 잘 살아있다. 그래서인지 부동산업자도 종종 그 집 주인과 연락하기 위해 이장님 연락처를 묻곤 한다.(시골에선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이장님을 통한 연락이 관례이다.) 우리집에 놀러온 지인도 그 집이 궁금하다며 잠겨진 대문이 아닌 다른 통로로 집으로 살짝 들어가 집 구경을 했다. 장독대도 그대로 놓여있고 살림살이도 그대로이다. 하지만 6년째 빈집이고 누구하나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50대쯤 되어보이는 아저씨가 집안에 있는 나무와 풀들을 정리하고 돌아갔다. 그 아저씨가 하루 종일 나무와 풀들과 씨름하는 순간 집에 새겨진 삶이 다시 살아나올것만 같았다.

▲ 언젠가 다시 삶이 시작될것 같은 집

▲ 깔끔한 할아버지를 닮은 집
쉽사리 빌려주지도 팔지도 않는 우리 동네 빈집의 주인을 이제 원망하지 않는다. 그 집에는 가족들이 살아왔던 이야기가 고스란히 새겨져있기 때문이다. 집을 둘러싼 마을과 마당, 텃밭, 축사 등등 모든 곳에 삶이 있고 놀이가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의 애환이 있었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집안 곳곳에 새겨져 내가 아닌 타인에게 빌려줄 수도 팔수도 없었을 것이다.
나와 같은 도시에서 자란 사람의 사고구조는 집이란 자본을 증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해 다른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한옥집은 70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70년 동안 이집에서 태어나고 죽고 자랐던 사람만 몇 명이었을까? 종종 이집에서의 추억이 그리워 30대의 청년과 친구들이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내가 살고 있으니 그냥 주변만 서성거리다 돌아갔다. 60대의 노인분도 우연히 이곳을 지나치는데 이곳에서 놀았던 기억을 회상하며 돌아갔다.

▲ 70년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새겨져있는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