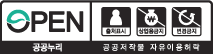가을빛 곱게 내린 고찰 무량사에서 무량한 번뇌를 벗어 보자!!!
 |
||
눈물이 나올만큼 시린 하늘을 볼 수있는 하늘이 있어 가을은 아름다운 것일까요? 아니면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나무들의 마지막 불꽃을 볼 수있기에 아름다운 것일까요?
가을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상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담을 수도 버릴 수도없는 짙은 가을색은 그저 눈으로 가슴으로 향기를 맡으라 합니다.
지난 9일 꿈을 키우는 신비의 섬 외연도를 다녀 오며 들린 가을색이 물들어 가는 고찰 무량사에 서 보았습니다.
신라 문성왕(서기839-856)때 범일국사(810-889)에 의해 창건되어 여러 차례 중수(重修)를 거쳐 오늘에 이른 무량사[無量寺]는 충남 부여군 외산면(外山面) 만수리 116번지 만수산(萬壽山) 남쪽 기슭에 있는 고색의 천연고찰로 국가지정 보물 6점과 지방문화재 7점 향토유적 3점을 보유하고 있는 절집이기도 하며 조선초기의 문인이며 생육신의 한사람인 매월당(梅月堂) 김시습이 이곳에서 59세의 나이로 병사하여 더욱 더 유명한 절집입니다.
만수산의 기슭, 대체로 평탄하고 산림(山林)이 울창한 곳에 위치한 무량사에는 드물게 보는 2층 불전(佛殿)이며 밖에서 보기와는 달리 내부는 상 ·하층의 구분이 없는 구조로 지어진 보물 제356호로 지정된 극락전이 중심이라 하겠습니다.
 |
||
| ▲ 만수산 무량사 일주문 | ||
그 극락전을 보러 가는 길은 일주문을 지나 이어져 있는데 길이 화강암으로 너무 반듯하게 꾸며져 있어 여느 절집의 운치있는 분위기와는 다른 유원지나 공원 같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고색찬연한 일주문을 지나 길 끝의 다리를 건너면 잠시 높은 키를 자랑하는 수목들이 색색이 물들어 가고 있고, 작은 개울을 흐르는 물가에는 키작은 풀과 나무들이 지나온 여름을 잊고 새로운 계절을 맞아 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휘돌아 들면 몇개의 개단을 앞에 두고 불법을 수호하는 불국 정토의 외곽을 맡아 지키는 신 사천왕(四天王)이 안치된 전각 천왕문이 나타납니다. 일주문처럼 오래된 느낌은 없는 천왕문 너머로 노랗게 물든 느티나무, 오층석탑과 극락전의 모습이 비칩니다.
 |
||
| ▲ 단풍이 곱게 든 극락전 앞 느티나무 | ||
넓은 절집 마당 한켠...
사철 푸른 소나무와 갈색으로 곱게 단장한 거대한 느티나무는 인간이 만든 구조물을 굽어 보듯 서 있고, 그 아래 가을을 잔뜩 이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모습은 좋은 비교가 되는 듯합니다.
우주의 눈으로는 티끌보다 작을 수 있는 존재인 인간...
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연장을 사용하는 몇 않되는 영장류 중에서 최고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자연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구조물을 만들어 냅니다.
그 손으로 한땀 한땀 만들어 낸, 우리 나라 여느 건축에서는 보기 드문 2층 모습의 극락전은 임진왜란 때 크게 불탄 무량사를 인조 때에 중창하며 지은 것으로 조선 중기 건축의 장중한 맛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로 보물 제35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
| ▲ 무량사 극락전의 모습 | ||
이러한 형식은 5층 목탑 형식인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3층 전각인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과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에서 볼수 있는 건축물이며 바깥에서 보기와 달리 안으로 들어서면 천장까지 뚫린 통층(通層)인데 이렇게 2층을 형태로 올린 것은 기능보다는 위엄과 장엄함을 나타내려는 의도 같습니다.
극락전 안에는 163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된 소조아미타삼존불 (보물 제1565호)이 모셔져 있는데 가운데에 아미타불(5.4m)이, 양쪽에 관세음보살(4.8m)과 대세지보살(4.8m)이 있으며 이 아미타삼존불은 흙으로 빚어 만든 소조불로서는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
||
| ▲ 무량사 극락전의 고색 창연한 단청 | ||
또 1627년 세로 12m, 가로 6.9m의 큰 모시천에 그린 괘불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가운데 모신 미륵보살의 광배를, 16화불들이 춤추듯이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매우 아름답다고 하며 괘불(미륵불)은 보물 제1265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괘불은 사월초파일이나 다른 재(齋)를 올릴 때에나 절 마당에 내어 건다고하니 그때에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 ▲ 무량사 오층석탑과 석등 | ||
넓고 평평하게 꾸며져있는 극락전 마당에는 보물 제185호로 지정된 장중한 느낌의 오층석탑이 석등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 조성된 백제계 석탑으로 보는 이 오층석탑은 1971년에 탑을 보수할 때 5층 몸돌에서 청동합 속에 든 수정병, 다라니경, 자단목, 향가루와 사리 등 사리장치가 나오고 1층 몸돌에서는 남쪽을 향하여 있는 고려시대의 금동아미타삼존불이 나왔다고 하며 전체적인 모습은 나지막한 2층 기단 위에 매우 안정된 비례로 5층이 올려져 있는데 상륜부에는 노반, 복발, 앙화가 소박한 형태로 얹혀 있어 탑이 무거워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은 부여 정림사터 탑을 그대로 빼닮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물 제233호로 지정되어 있는 석등 역시 오층석탑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상대석과 하대석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연꽃이 조각되어 있고 팔각 화사석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이 통일 신라 이래 우리 나라 석등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춘 고려 초기 석등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오층석탑과는 석질이 완연히 달라 보여 제작 시기가 같다고 보는 점에 의구심은 들지만 전체적으로 선이나 비례가 매우 아름다운 석등입니다.
천왕문에서 부터 이어진 낮은 담장이 둘려져 있는 개울을 건너 삼성각과 청한당이라 불리는 요사채가 있습니다. 요사채에는 새로이 자리한 주지 석파스님이 기거하는 곳인 듯하였습니다.
오직 우리나라의 절집에만 있는 삼성각에서 다시 극락전 방향으로 숲길을 걷다보면 마주 보는 쪽에 건물군이 나타납니다.
그 자리 원통전 바로 앞에는 다른 절집과 달리 영정각이 있는데 이는 조선초기의 문인으로 금오산실에서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 [금오신화(金鰲新話)]를 지었고, [탕유관서록(宕遊關西錄)], [탕유관동록(宕遊關東錄), [탕유호남록(宕遊湖南錄)등을 정리했으며 [산거백영(山居百詠)]을 쓴 생육신의 한사람인 매월당(梅月堂) 김시습의 자화상으로 알려진 작자 미상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
||
| ▲ 매월당 김시습의 영정이 모셔진 영정각과 부도 | ||
매월당(梅月堂) 김시습은 어려서 부터 신동·신재(神才)로 이름이 높았으며 5세 때부터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생육신으로 끝까지 절개를 지키며 유·불(儒佛) 정신을 아울러 포섭한 사상과 탁월한 문장으로 일세를 풍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무량사에 있던 1493년(성종 24) 59세의 나이로 죽을 때 화장하지 말 것을 유언하여 이를 지키기 위해 절 옆에 시신을 안치해두었는데, 3년 후 장사를 지내려고 관을 열어보니 안색이 생시와 같았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부처가 된 것이라 믿어 유해를 불교식으로 다비(茶毗)를 하고 유골을 모아 부도(浮圖)에 안치하였다고 전합니다.
그는 사후 1782년(정조 6)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영월(寧越)의 육신사(六臣祠)에 배향(配享)되었습니다.
그의 부도는 무량사 입구의 좌측에 놓인 다리를 건너면 오른쪽 산기슭에서 만나게 되는 부도군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량사 경내를 돌아 나오는 길...
무심한 듯 서있는 갈색잎의 느티나무는 수백년의 세월을 이고 나면서 어쩌면 이미 부처가 되어 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
| ▲ 무량사 일주문의 또 다른 이름 광명문 | ||
절집 공간이 광명인지 세속이 광명인지, 승속의 경계에 지어진 일주문. 그 나가는 문의 이름 광명문을 나서며 혼돈의 시대를 사는 한 인간으로서 지극히 감상적으로 만들어 주는 가을의 향기를 털어 내려 애써 고개를 흔들어 봅니다.
한 차례 꿈을 꾸듯...
그 꿈 조차 꿈 속의 꿈 이련만, 삶과 죽음 역시 꿈 속의 일 이어서 의미 또한 없음인데 남을 이기기에만 바쁜 우리는 어디에 머무는 것인지...
정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음을 뜻하는 무량... 가을빛이 그윽히 내려앉는 무량사[無量寺]에서 무량한 번뇌를 지우려 애를 써 봅니다.
이 가을...
속세의 이기를 접고 그저 바람처럼 가볍게 천년 고찰 무량사를 들러 보는 것은 어떨지요.
그저 떨어지는 낙엽 하나에도 최선을 다한 삶이 있었슴을 느껴 보심은 어떨지요.
이기기 보다는 함께 함이, 가짐 보다는 나눔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