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리포터] 슬로시티 대흥 방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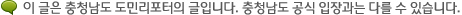

충남에선 처음으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예산 대흥마을을 찾았다.
슬로시티는 1999년 이탈리아의 몇몇 시장들이 모여 '느리게 먹기'와 '느리게 살기 운동'을 펼치며 시작됐다.
'느림은 사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실천하고 있는 예산 대흥은 풍요로운 자연생태를 보존하고 고유한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활발한 지역민의 커뮤니티 활동으로 2009년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았다. 신안 증도, 완도 청산, 장흥 유치, 담양 창평, 하동 악양에 이어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슬로시티다.
대흥에 도착하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예당저수지였다. 우리 동네에 있는 저수지(백제호)보다 훨씬 컸다. 크기도 크기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더 애틋했다. 예당저수지는 1929년에 착공하여 1964년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당시만 해도 보상금이 미미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마을주민 대부분은 저수지 침수때문에 자신의 삶 터를 버리고 떠날수 밖에 없었고, 예전엔 왕래가 잦았던 마을끼리의 소통도 저수지때문에 단절되었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흥이 다시 슬로시티로 지정되면서 다른 마을 사람들끼리 소통도 더 많아졌다고 한다.
예당저수지는 대흥 사람들에게 만감의 산물처럼 느껴졌다.
먼저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에 비해서 대흥은 마을의 인프라보다는 사람들에게 투자를 우선했다고 한다. 마을의 자원을 마을 주민이 잘 알고 있어야 해설할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들고 사람을 양성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의 공감을 얻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슬로시티가 지정되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진행됐다고 한다. 민과 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다른 점이면 다른 점이라고도 했다. 처음에는 '슬로시티'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마을의 개발을 원하는 몇몇 분들이 매우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슬로'의 뜻을 잘 이해하고 오히려 반대했던 사람들이 더 적극 마을을 위해 애쓴다고 했다. 마음을 열고 마을에 무언가 바람이 불고 있다고 주민이 믿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발전해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슬로시티 방문자 센터에서 나와 마을을 이곳저곳 거닐다 보니, 이곳이 왜 슬로시티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았다. 우리 동네 면사무소는 마을 한가운데 교통이 편하고 북적북적한 곳에 있는 반면에 대흥면사무소는 마을 문화재인 대흥동헌 옆에 조용히 있었다.
마을을 거니는 길이 옛이야기 길, 느림 길, 사랑 길로 조성돼 있었고 나무 하나하나에는 마을 주민의 명패가 걸려 있었다. 우리 시골 처럼 조용했지만 사람이 모두 떠나 스산한 느낌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묵묵히 있는 아주 오래된 나무처럼 조용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대흥항교에 올라가 마을 전체를 바라볼 때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들이 바람에 씻겨가는 것 같았다. 역시나 '자연' 속에는 '피톤치드'와 같은 성분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슬로시티 대흥을 보면서 나는 자꾸만 배가 아팠다. 솔직히 부러웠다.
우리 동네도 저수지가 있지만, 마을 사람들 간의 단절을 불러왔다. 대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멋스러운 자연경관이 대신하고 있다. 어른들이야 그러려니 하겠지만 내게 저수지에 대한 감회는 남다르다.
어린 시절 학교에 함께 다니는 동네 친구를 저수지 건너편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러야 그나마 몇 마디 나눌 수 있었다. 게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 집은 예전보다 더 살기 어려워져 마을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에 비해 슬로시티 대흥은 마을 사람들끼리 소통도 넘쳐나고 이제는 외지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고 한다.
요즘 마을 개발이 이슈가 되면서 농촌마을끼리의 경쟁과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던데 그 이야기가 공감이 갔다.
'개발'과 '경쟁'이 싫어서 농촌에 머물고 농촌으로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농촌에서도 '개발'과 '경쟁'이 꿈틀대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농촌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도 격차는 생기기 마련이고, 안 그래도 서러운 농촌 사람들에게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을 포용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본다. 농업을 살리는 것과 농촌을 살리는 것은 다르다. 어떻게 보면 작은 분야의 해결책일 수도 있겠지만 슬로시티 대흥이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나가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